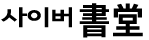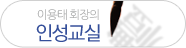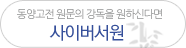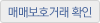자료 창고
- - 이하 데이터 업데이트중 -
- 이야기한자여행
- 서당 게시판 종합
부수로 부수는 한자
부수로 부수는 한자 : 흙 토
-
32. 더하기[+]와 빼기[-] - 흙 토(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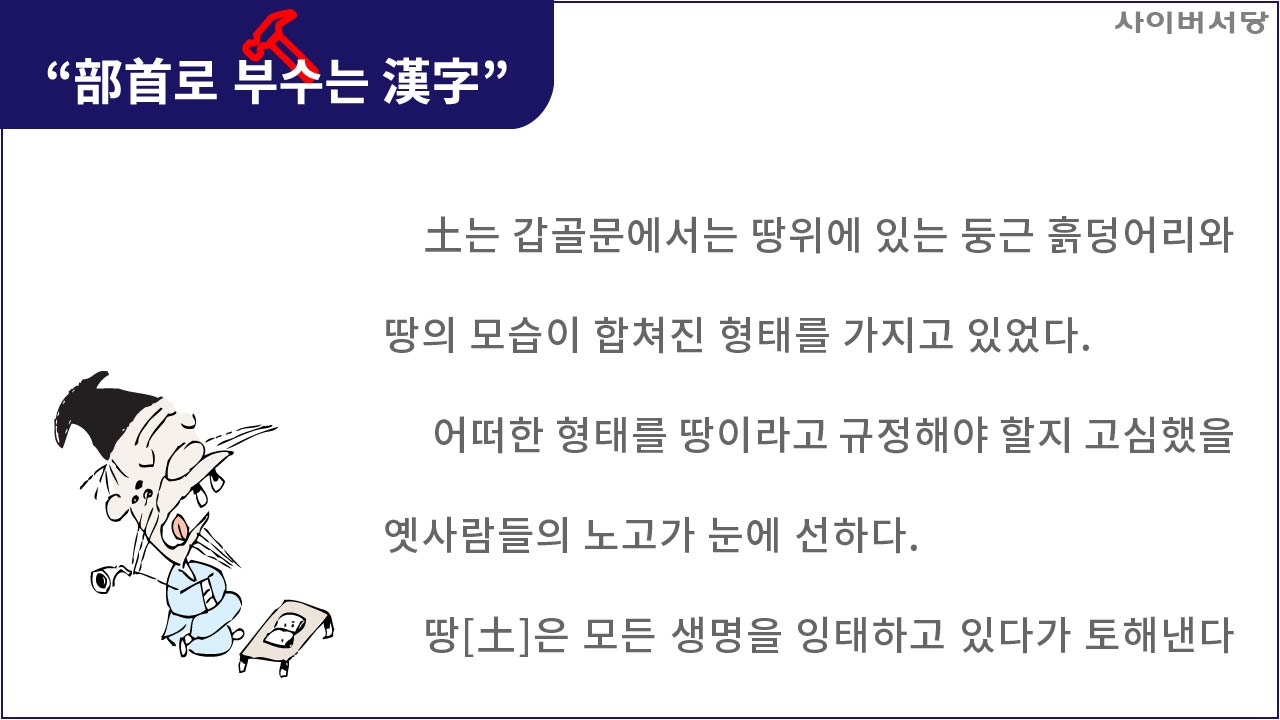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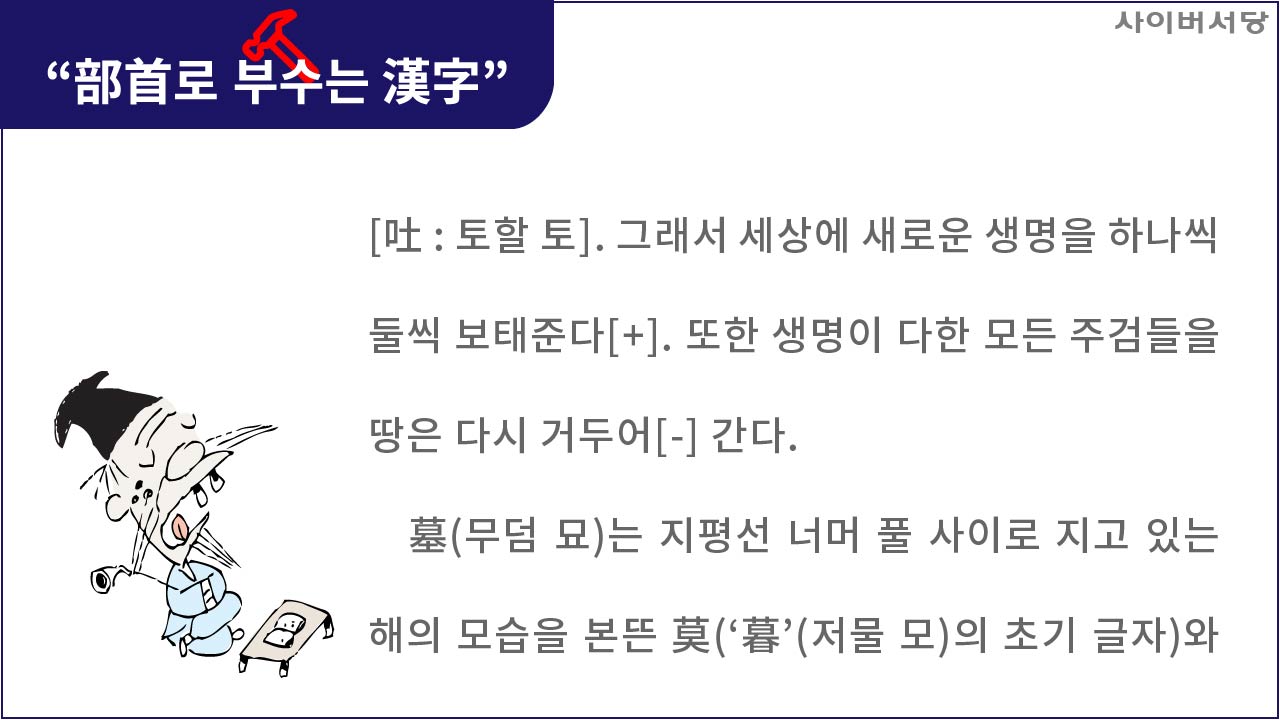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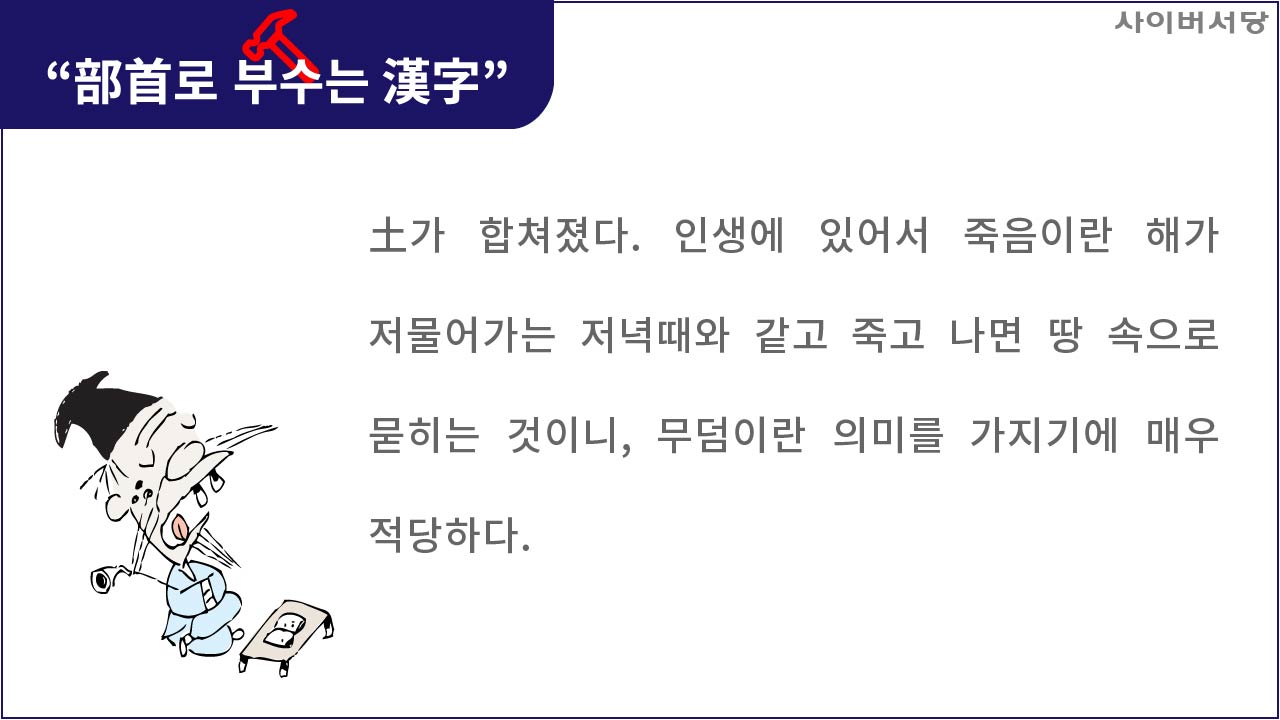
土는 갑골문에서는 땅위에 있는 둥근 흙덩어리와 땅의 모습이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형태를 땅이라고 규정해야 할지 고심했을 옛사람들의 노고가 눈에 선하다. 땅[土]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토해낸다[吐 : 토할 토].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씩 둘씩 보태준다[+]. 또한 생명이 다한 모든 주검들을 땅은 다시 거두어[-] 간다.
墓(무덤 묘)는 지평선 너머 풀 사이로 지고 있는 해의 모습을 본뜬 莫(‘暮’(저물 모)의 초기 글자)와 土가 합쳐졌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때와 같고 죽고 나면 땅 속으로 묻히는 것이니, 무덤이란 의미를 가지기에 매우 적당하다.
죽어서 하늘나라인 천당을 갈망하는 생전의 바람과는 반대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작은 관[지옥]에 시신을 넣어 땅 속[지옥]에 묻어버린다. 생전의 바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너나 할 것 없이.글 박상수(단국대 강사,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닫기
닫기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