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창고
- - 이하 데이터 업데이트중 -
- 이야기한자여행
- 서당 게시판 종합
부수로 부수는 한자
부수로 부수는 한자 : 삼 마
-
200. 여인들의 피와 땀 - 삼 마(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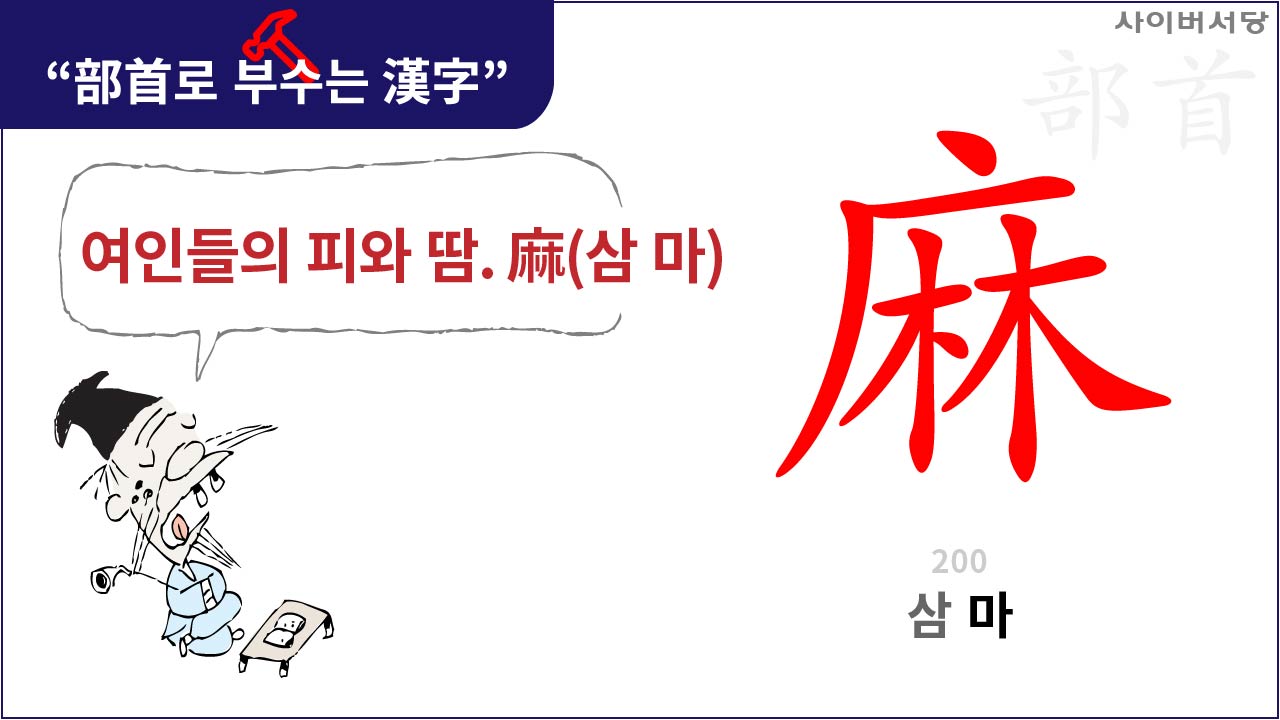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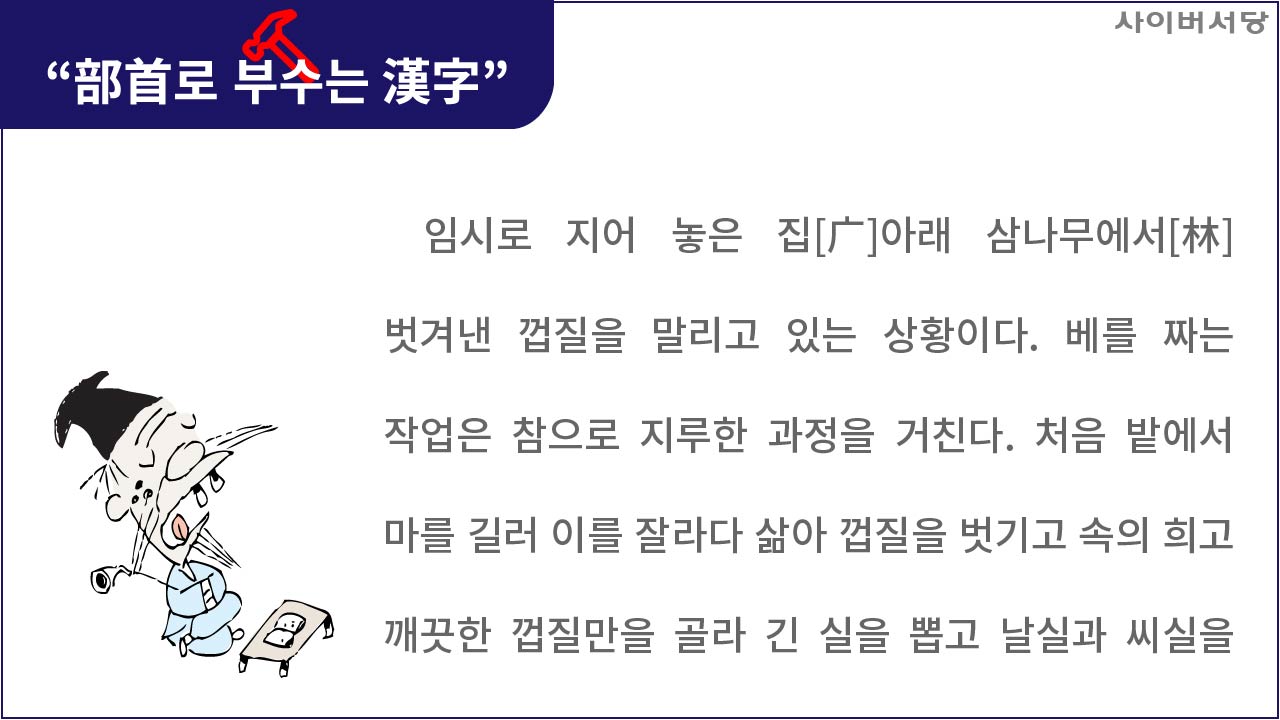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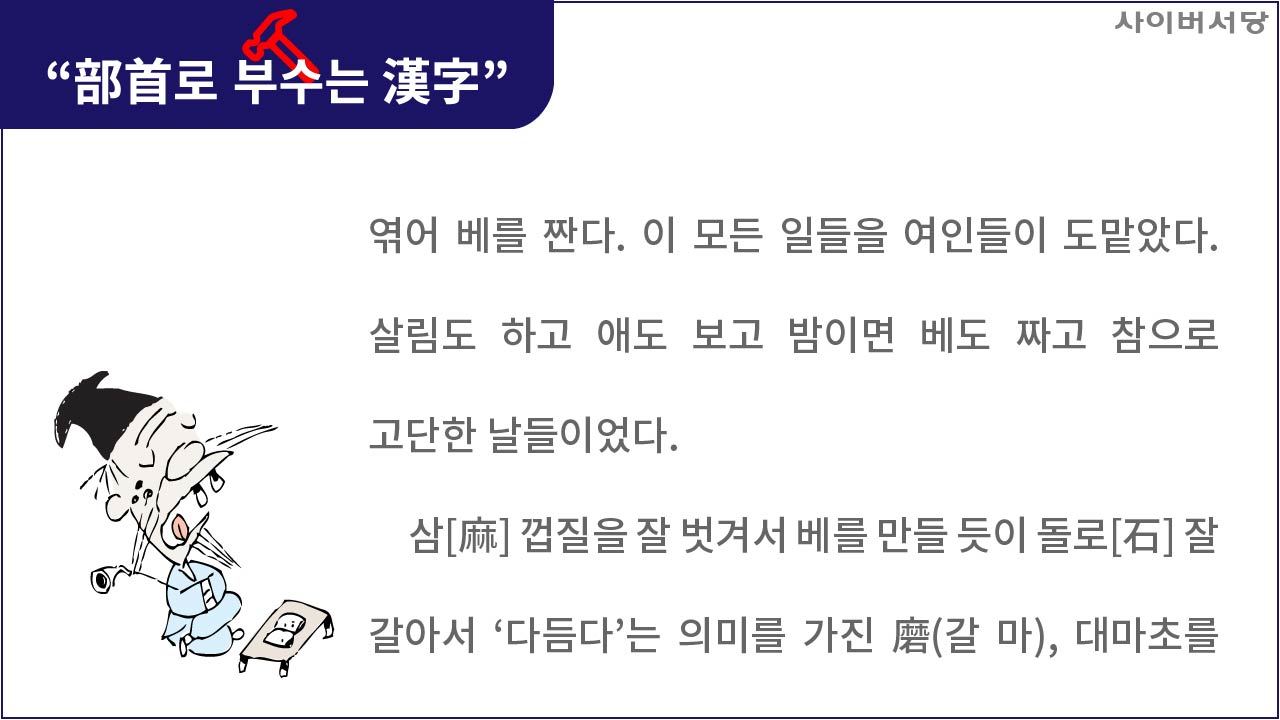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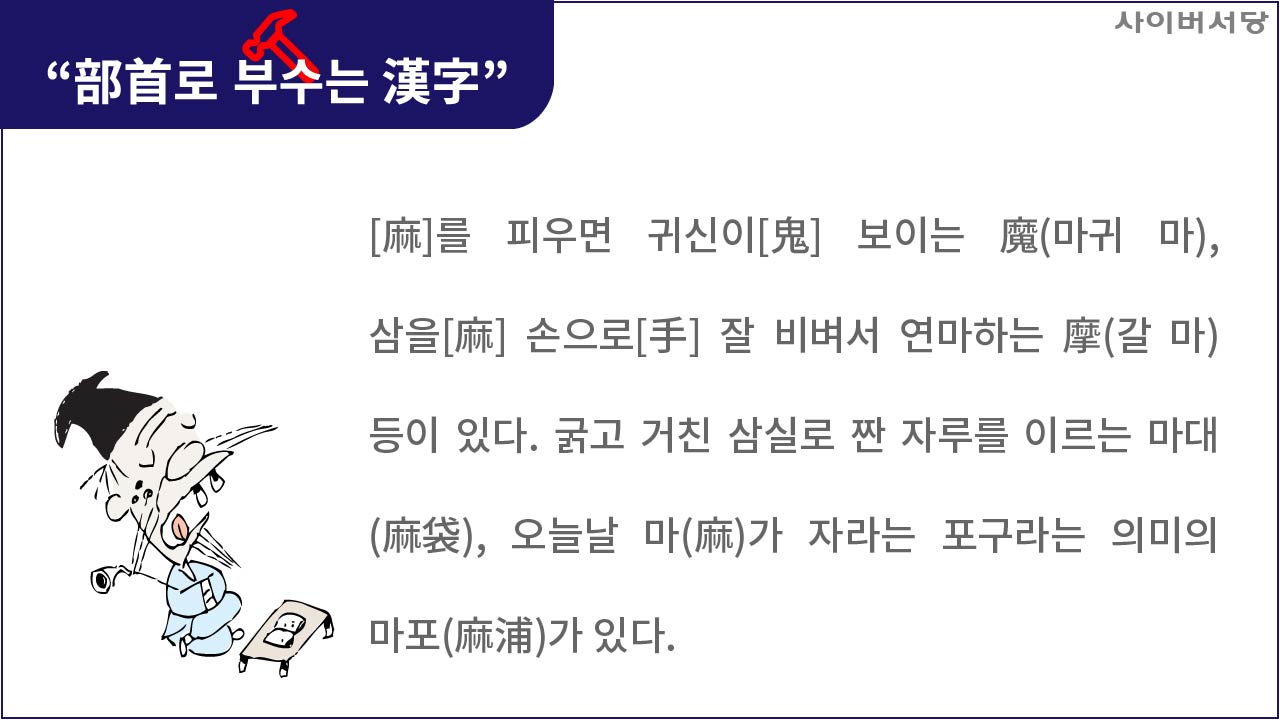
임시로 지어 놓은 집[广]아래 삼나무에서[林] 벗겨낸 껍질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베를 짜는 작업은 참으로 지루한 과정을 거친다. 처음 밭에서 마를 길러 이를 잘라다 삶아 껍질을 벗기고 속의 희고 깨끗한 껍질만을 골라 긴 실을 뽑고 날실과 씨실을 엮어 베를 짠다. 이 모든 일들을 여인들이 도맡았다. 살림도 하고 애도 보고 밤이면 베도 짜고 참으로 고단한 날들이었다.
삼으로 옷을 짠 것이 바로 삼베인데, 그 잎을 잘못 활용하면 대마초(大麻草)가 된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이 된다.
삼[麻] 껍질을 잘 벗겨서 베를 만들 듯이 돌로[石] 잘 갈아서 ‘다듬다’는 의미를 가진 磨(갈 마), 대마초를[麻] 피우면 귀신이[鬼] 보이는 魔(마귀 마), 삼을[麻] 손으로[手] 잘 비벼서 연마하는 摩(갈 마) 등이 있다. 굵고 거친 삼실로 짠 자루를 이르는 마대(麻袋), 오늘날 마(麻)가 자라는 포구라는 의미의 마포(麻浦)가 있다.
1363년 문익점(文益漸)이 목화씨를 밀수입하기 전까지 서민들의 겨울옷은 참으로 보잘 것이 없었다. 이후 목화가 들어와 천 사이에 목화솜을 집어넣은 누비옷을 만든 후에나 겨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정도였지 그 이전에는 여러 천만 덧댄 옷만으로 겨울을 났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겨울나기는 그래도 호강이다.글 박상수(단국대 강사,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닫기
닫기 로그인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