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창고
- - 이하 데이터 업데이트중 -
- 이야기한자여행
- 서당 게시판 종합
부수로 부수는 한자
부수로 부수는 한자 : 말 마
-
187.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 말 마(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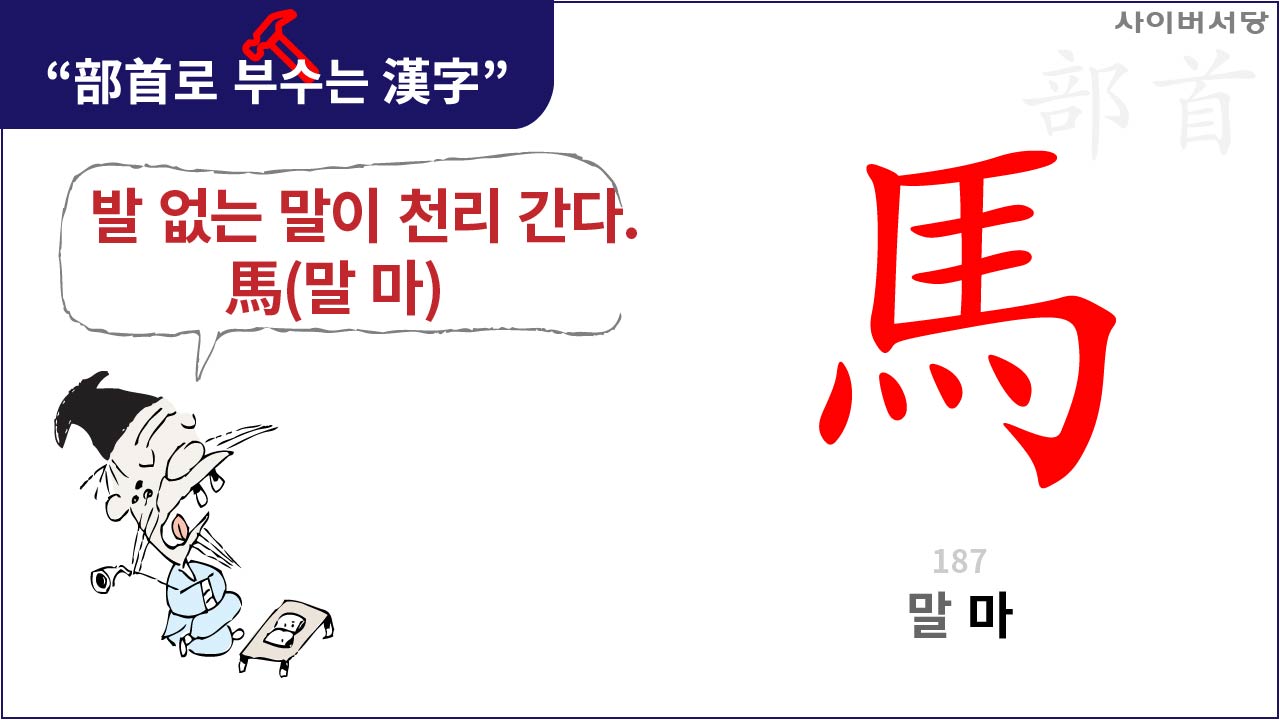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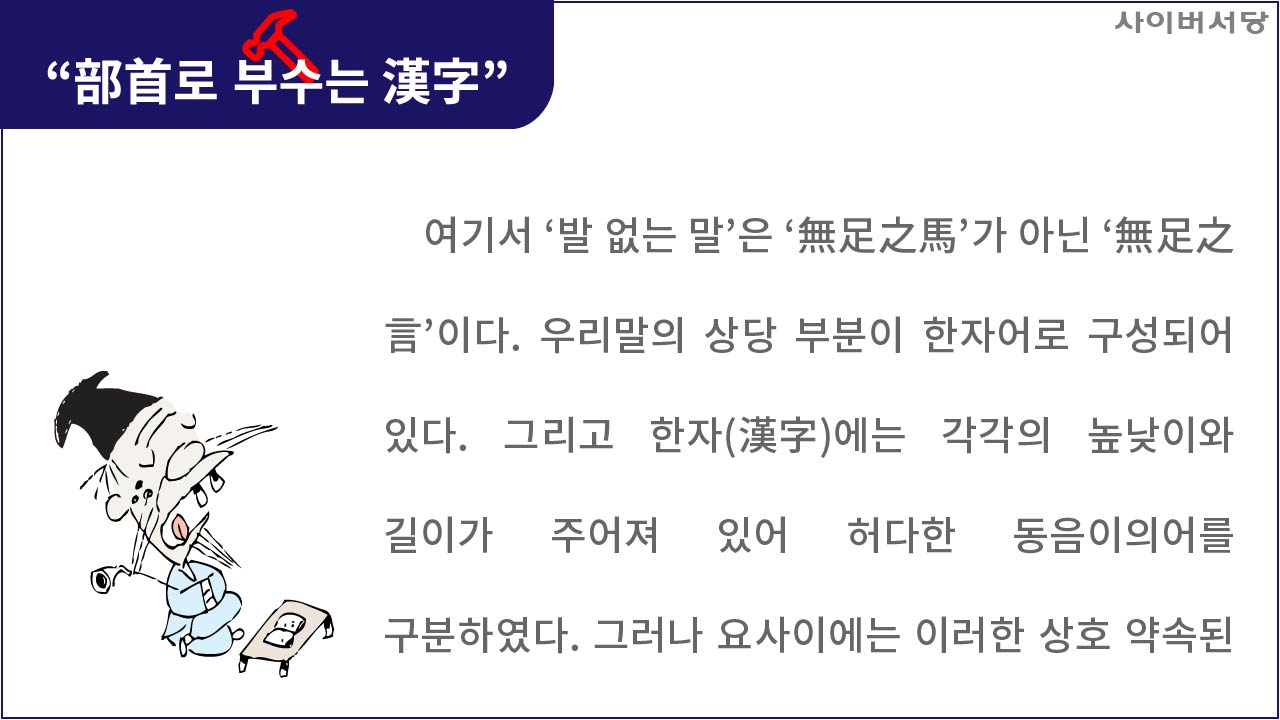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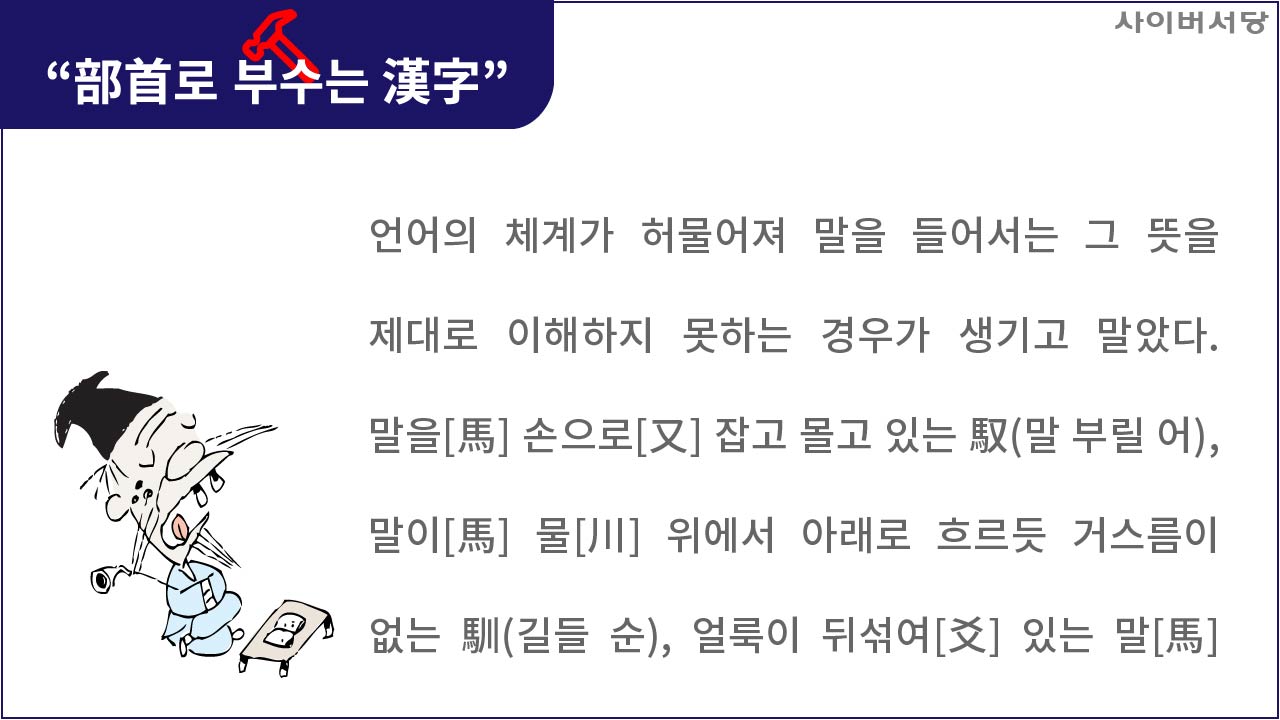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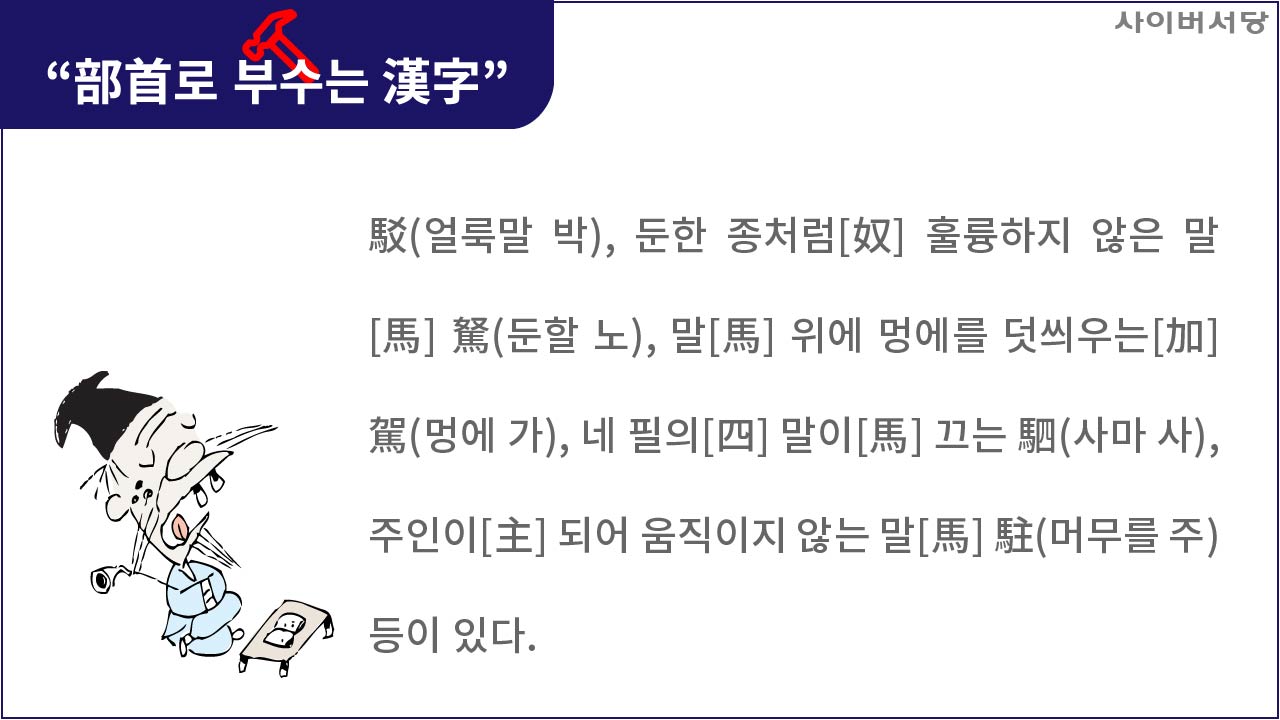
여기서 ‘발 없는 말’은 ‘無足之馬’가 아닌 ‘無足之言’이다. 우리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자(漢字)에는 각각의 높낮이와 길이가 주어져 있어 허다한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요사이에는 이러한 상호 약속된 언어의 체계가 허물어져 말을 들어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말았다. 말을[馬] 손으로[又] 잡고 몰고 있는 馭(말 부릴 어), 말이[馬] 물[川]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거스름이 없는 馴(길들 순), 얼룩이 뒤섞여[爻] 있는 말[馬] 駁(얼룩말 박), 둔한 종처럼[奴] 훌륭하지 않은 말[馬] 駑(둔할 노), 말[馬] 위에 멍에를 덧씌우는[加] 駕(멍에 가), 네 필의[四] 말이[馬] 끄는 駟(사마 사), 주인이[主] 되어 움직이지 않는 말[馬] 駐(머무를 주) 등이 있다.
사람을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며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말은 왜 제주도로 보내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섬에는 범이 살지 않아 말이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마목장(馬牧場)은 주로 섬에 두었다. 그와 반대로 한때 의정부지역에 녹양목장이라는 마목장을 둔 적도 있었지만 사육하던 말들이 모두 범으로 인해 피해로 목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글 박상수(단국대 강사,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닫기
닫기 로그인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