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창고
- - 이하 데이터 업데이트중 -
- 이야기한자여행
- 서당 게시판 종합
부수로 부수는 한자
부수로 부수는 한자 : 볼 견
-
147. 왕눈이 - 볼 견(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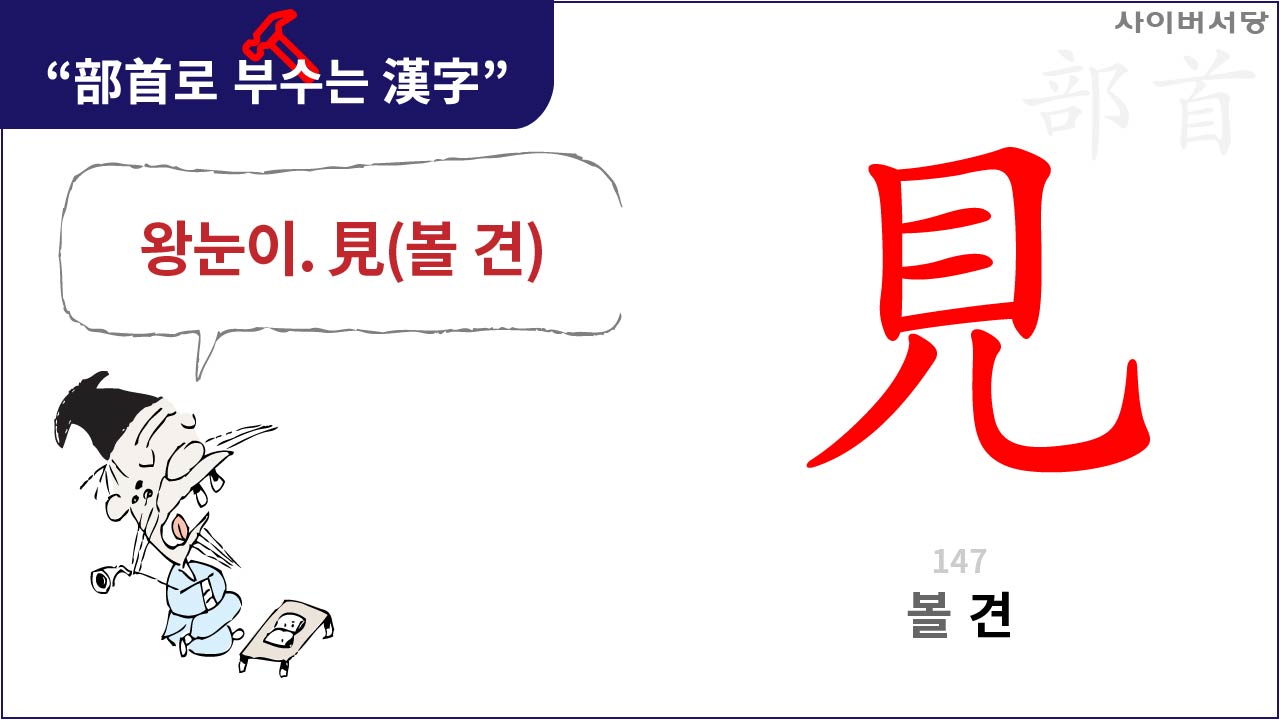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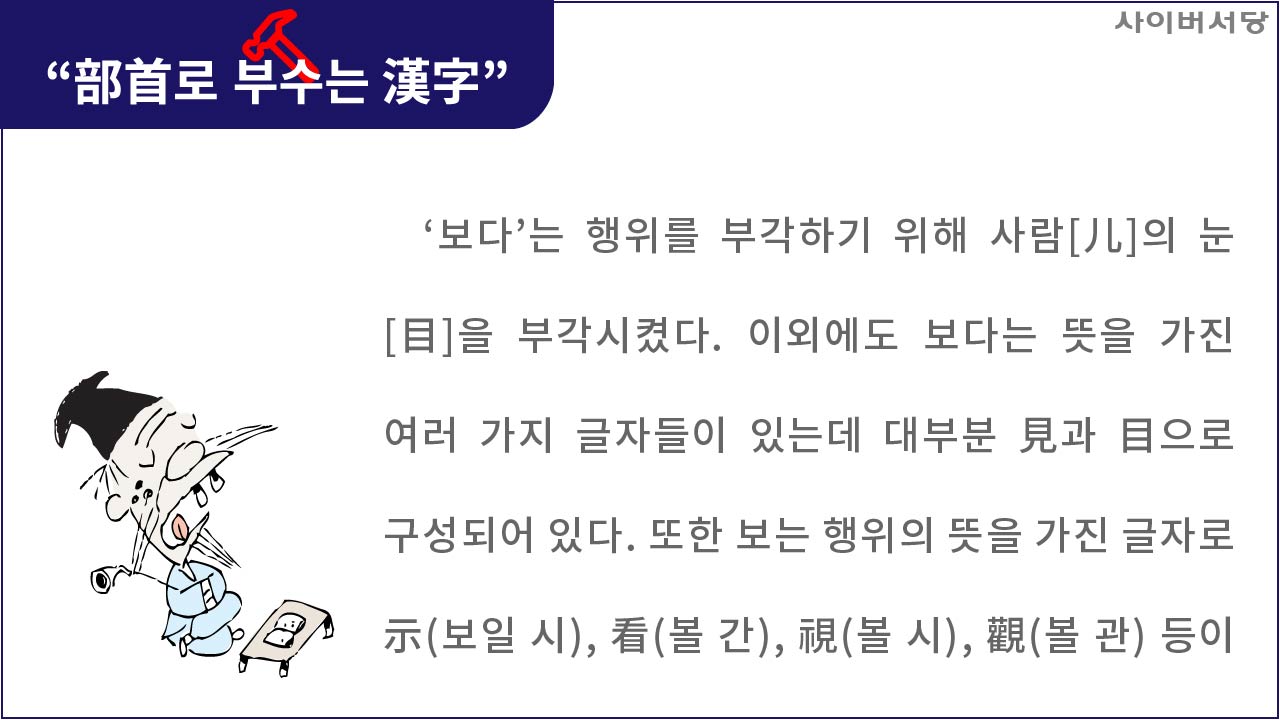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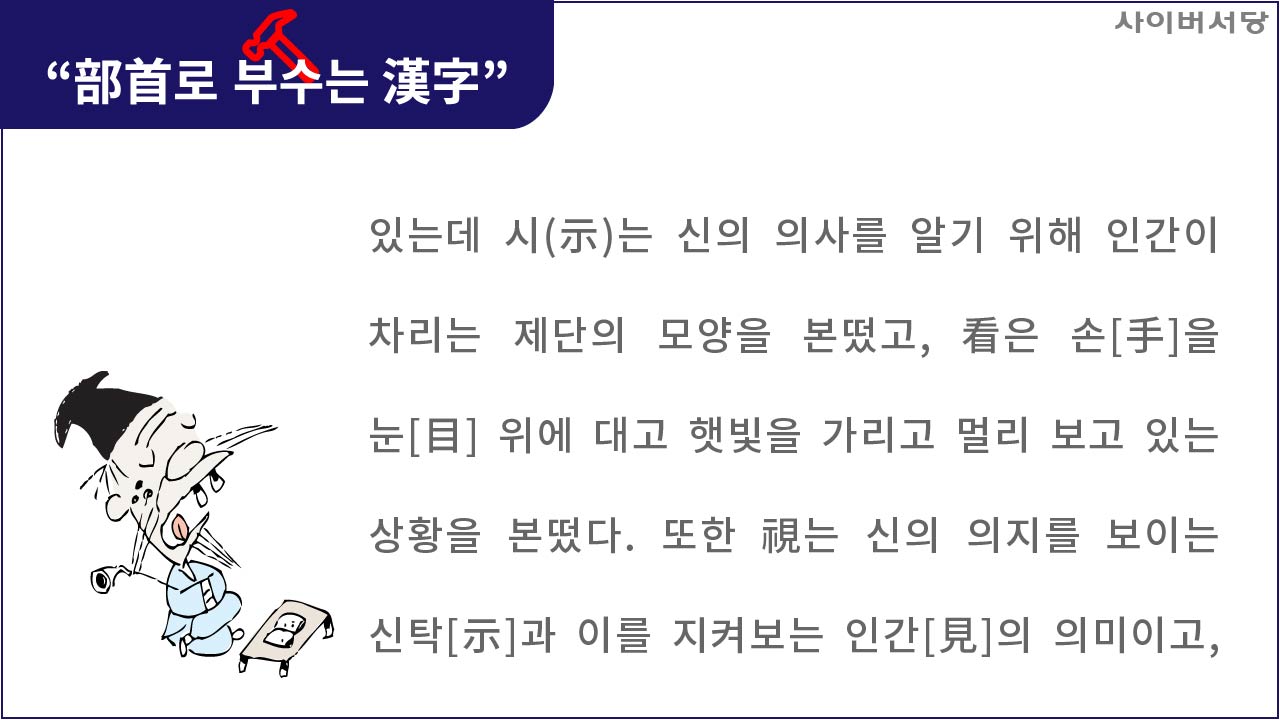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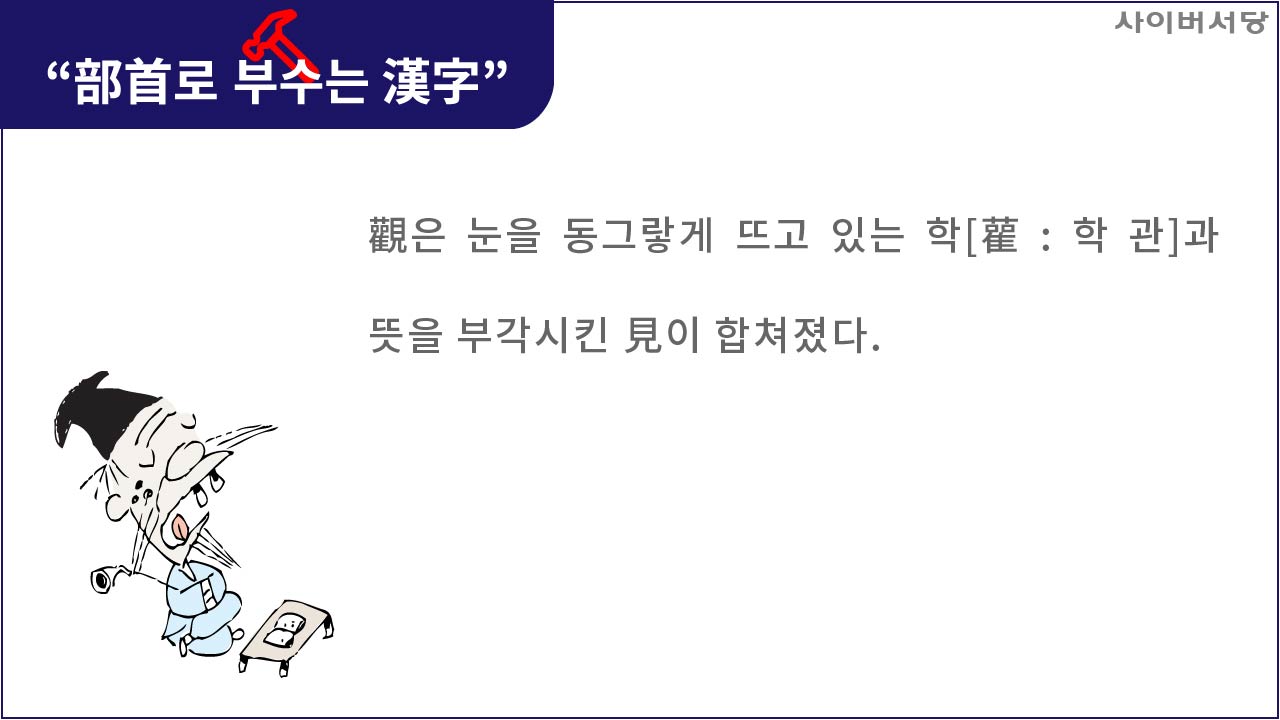
‘보다’는 행위를 부각하기 위해 사람[儿]의 눈[目]을 부각시켰다. 이외에도 보다는 뜻을 가진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見과 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는 행위의 뜻을 가진 글자로 示(보일 시), 看(볼 간), 視(볼 시), 觀(볼 관) 등이 있는데 시(示)는 신의 의사를 알기 위해 인간이 차리는 제단의 모양을 본떴고, 看은 손[手]을 눈[目] 위에 대고 햇빛을 가리고 멀리 보고 있는 상황을 본떴다. 또한 視는 신의 의지를 보이는 신탁[示]과 이를 지켜보는 인간[見]의 의미이고, 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학[雚 : 학 관]과 뜻을 부각시킨 見이 합쳐졌다.
16세기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중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을 가져왔다. 당시 유리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이라 안경알은 맑은 옥돌을 갈아서 만들었다. 이후 경주에서 질 좋은 옥돌이 나와 여기서 나오는 옥돌로 안경알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안경을 끼고 상대와 만나는 것을 예의에 벗어난다고 여겨 안경을 벗고 서로 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은 고종황제 때까지 내려와 이토 히로부미도 안경을 벗고 고종을 만났다고 하니 오늘날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글 박상수(단국대 강사,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닫기
닫기 로그인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