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창고
- - 이하 데이터 업데이트중 -
- 이야기한자여행
- 서당 게시판 종합
부수로 부수는 한자
부수로 부수는 한자 : 돌 석
-
112. 언덕 아래 작은 돌 - 돌 석(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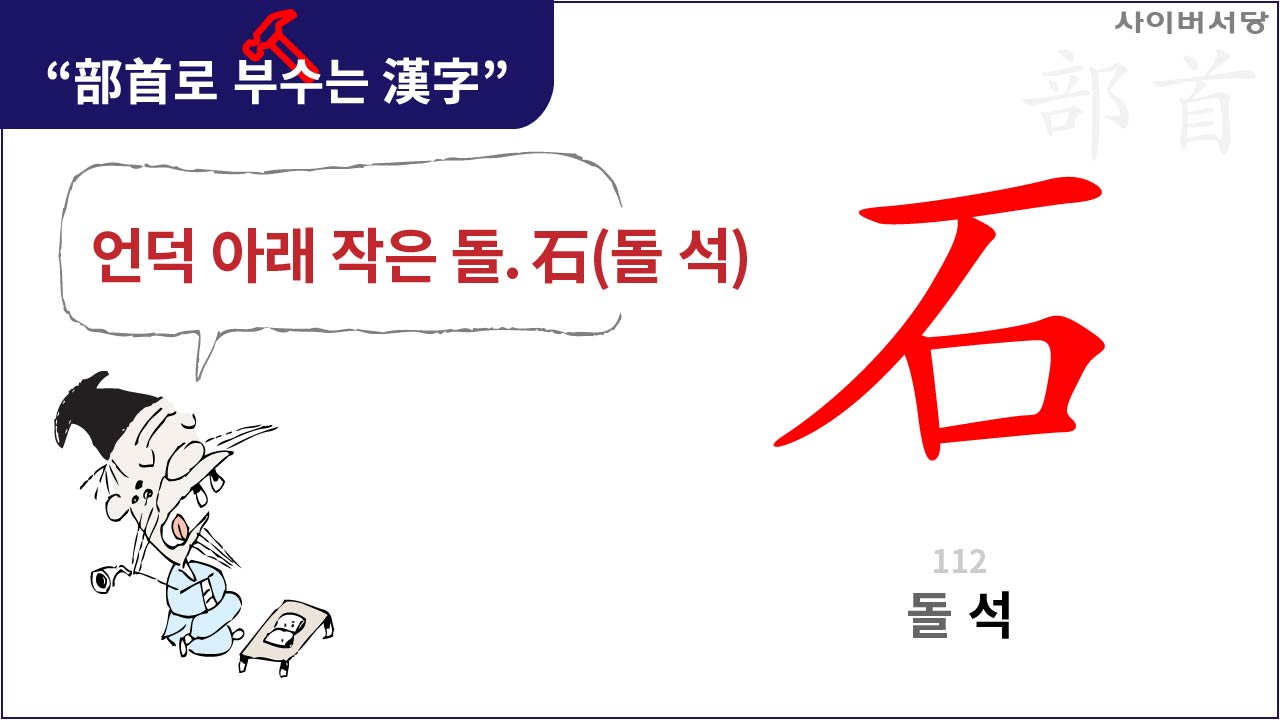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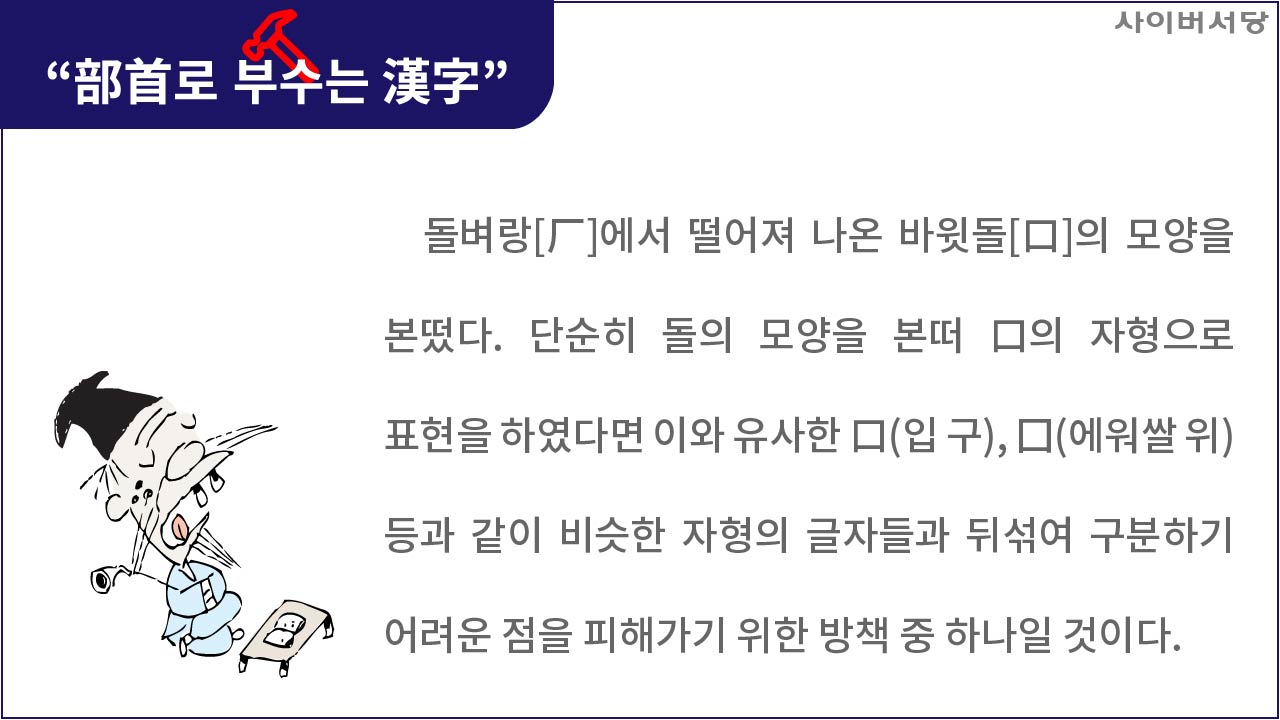
돌벼랑[厂]에서 떨어져 나온 바윗돌[口]의 모양을 본떴다. 단순히 돌의 모양을 본떠 口의 자형으로 표현을 하였다면 이와 유사한 口(입 구), 囗(에워쌀 위) 등과 같이 비슷한 자형의 글자들과 뒤섞여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피해가기 위한 방책 중 하나일 것이다.
향찰(鄕札), 이두(吏讀), 구결(口訣)의 경우처럼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도 고유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기도 하였고, 乭(돌 돌)처럼 우리식의 한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발음이 바뀌면서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도(獨島)’이다. 오늘날은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 ‘외로운 섬’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는 돌로 이루어진 섬이란 뜻의 ‘돌섬’이었다. 여기서 ‘ㄹ’이 ‘ㄱ’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가 된 것 일뿐 ‘홀로’라는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러한 예는 ‘돌로 담을 쌓은 뒤 밀물과 썰물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의 하나인 ‘독살’이라는 명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글 박상수(단국대 강사,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닫기
닫기 로그인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