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창고
- - 이하 데이터 업데이트중 -
- 이야기한자여행
- 서당 게시판 종합
부수로 부수는 한자
부수로 부수는 한자 : 가죽 피
-
107. 벗기면 피가 나와요. - 가죽 피(皮)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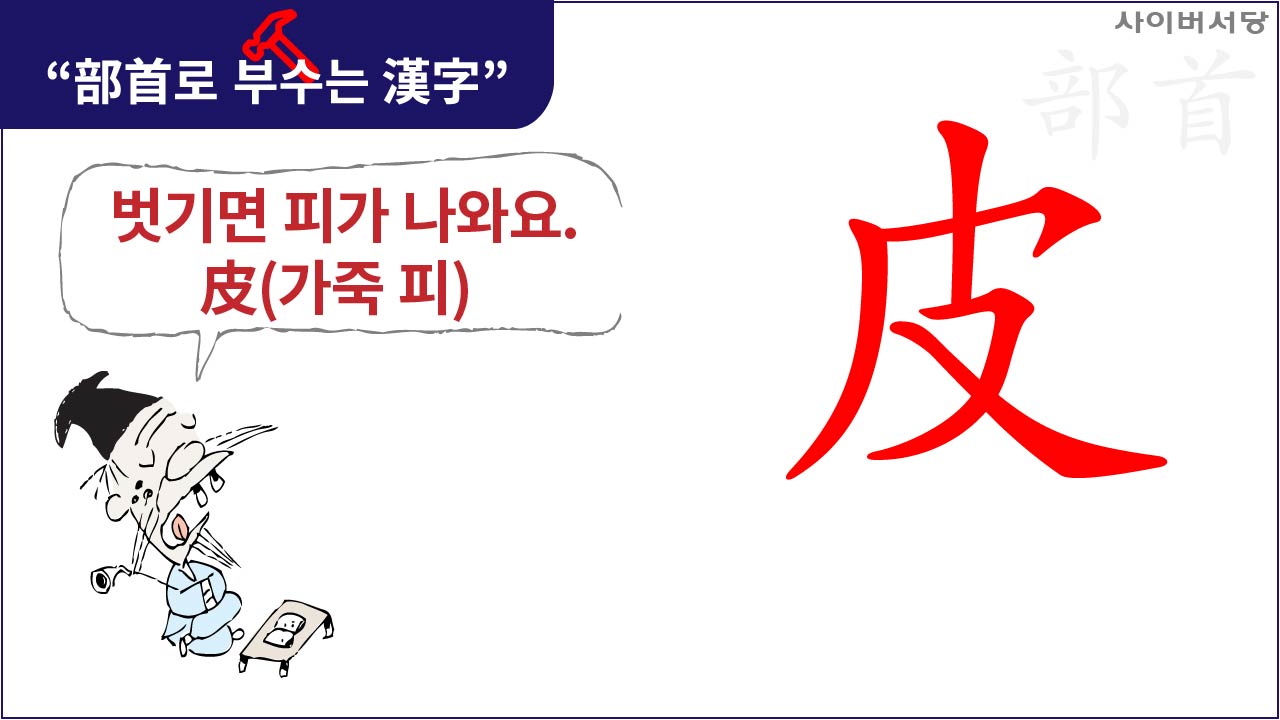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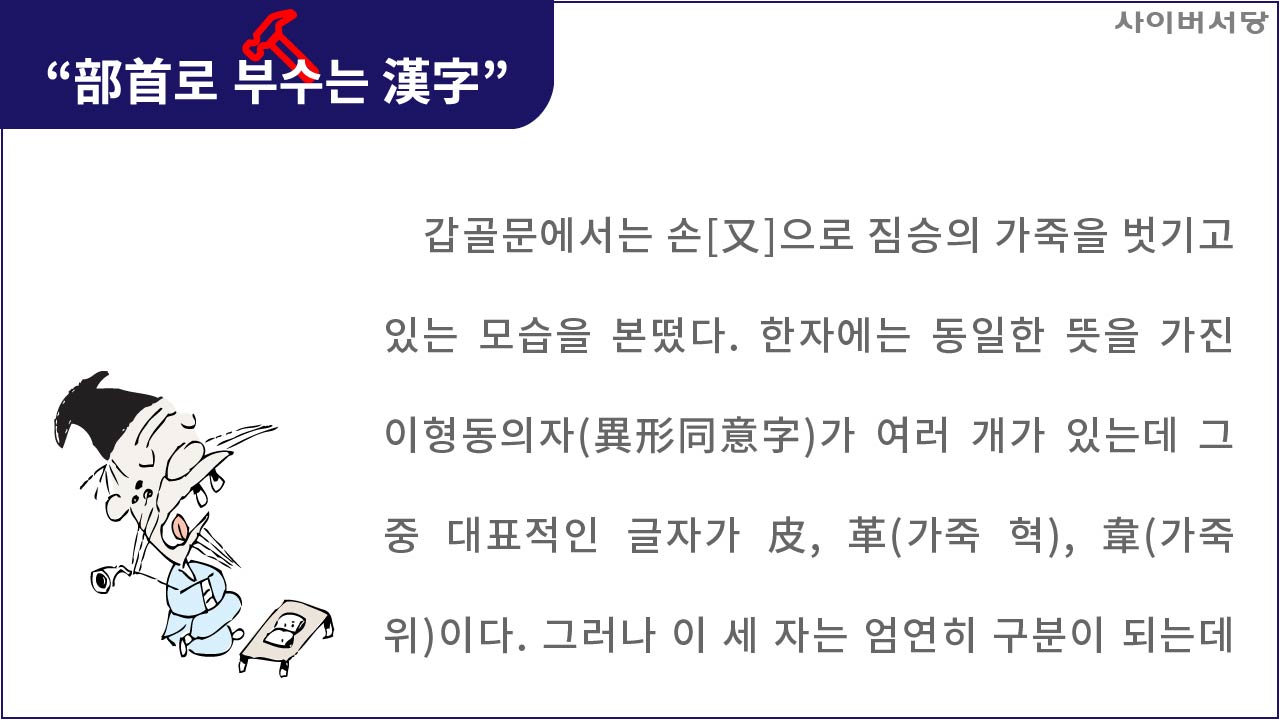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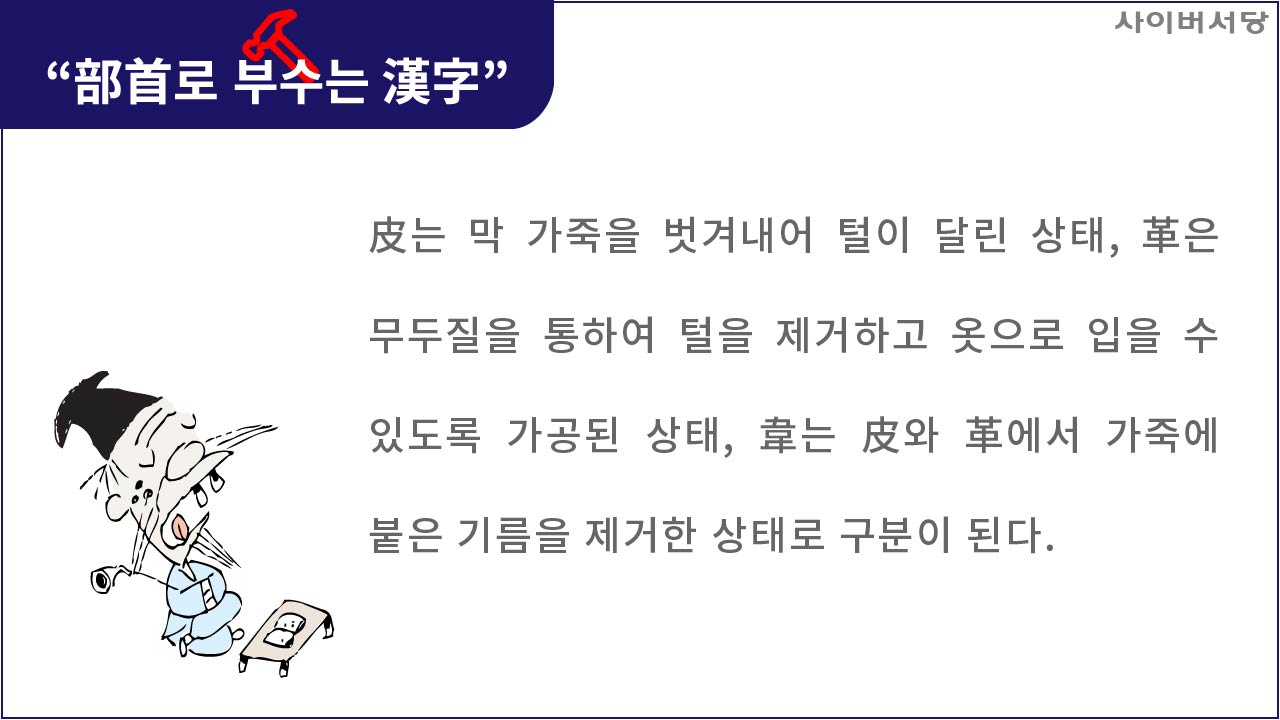
갑골문에서는 손[又]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본떴다. 한자에는 동일한 뜻을 가진 이형동의자(異形同意字)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글자가 皮, 革(가죽 혁), 韋(가죽 위)이다. 그러나 이 세 자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皮는 막 가죽을 벗겨내어 털이 달린 상태, 革은 무두질을 통하여 털을 제거하고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가공된 상태, 韋는 皮와 革에서 가죽에 붙은 기름을 제거한 상태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韋의 본래의 뜻은 ‘가죽’이 아닌, ‘포위하다’ ‘감싸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로, 두 발의 모양을 본뜬 舛과 어떠한 지역을 뜻하는 囗이 합쳐져 어떠한 지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본떴다. 또한 가죽은 몸을 감싸고 에워싸고 있는 부분이니 인신된 뜻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에워하다’는 본래의 뜻을 상실한 韋를 대신할 글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껴 창제된 글자가 바로 圍자이다. 또한 革이 오늘날 ‘革新’에서 ‘바뀌다’는 의미로 쓰이는 이유는 가죽의 털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양에서 바뀌어 버리는 상황에서 그 뜻이 파생된 것이다.글 박상수(단국대 강사,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닫기
닫기 로그인
로그인








